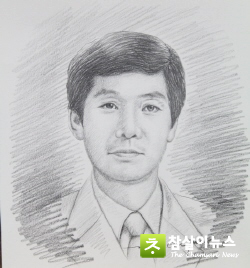
김용수 편집국장
즐거운 성탄절이다. 성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왠지 처량하다. 숙연하면서도 은은하게 들려야 할 종소리가 애처롭게 들려오는 것은 시국이 어수선해서 일까? 아님 송년의 아쉬움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소외계층의 삶을 걱정해서일까? 즐거워야할 성탄절이 무겁게만 느껴지면서 추위까지 몰려온다.
이런 날에는 학창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까뮈의 작품들이 생각난다. 페스트라는 작품에서 페스트에 고립된 마을과 목사 그리고 의사의 이야기들이 하얗게 그려진다. 까뮈가 추구했던 인간의 비리와 정의 그리고 심리가 잘도 묘사되었지 않았나 싶다.
어찌 보면 까뮈는 이미 서구 중심적 근대성의 신화에 회의하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현상과 공산주의 체제에 나타났던 여러 현상이 서구를 중심에 둔 근대성이라는 신화의 서로 다른 두 얼굴이라고 지적했던 점에 대해서 말이다.
게다가 모든 '절대성'이란 결국 그 절대적 정당성을 믿는 집단이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타인에게 폭력과 억압을 휘두르기 위한 준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진보'라는 개념에 대한 맹신을 버리는 일이다. 그러면서도 이성에 대한 믿음을 지속하는 일이다. 인간의 존재조건 자체가 불합리한데 그런 인간들이 모여 만든 사회가 어떻게 완전하게 합리적인 질서 속에 통일될 수 있겠는가?
어느 시대든 당대에는 단지 당대의 문제가 제시될 뿐이고,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유만이 있을 뿐이다. 죽음으로 마감하기 전까지 어떤 개인의 생애도 완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 또한 끝나기 전까지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다.
까뮈는 이방인에서도 뫼르소를 통해 모든 고결한 혼들은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법을 작품으로 나타냈다. 그 누가 인간에게 허용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를 한정할 수 있겠는가?
글쎄, 오늘 인생의 근원적인 부조리를 거부하거나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자신은 현실에서 결코 영원히 소외돼 있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정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몇 사람이나 될까?
어쩌면 군중 속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다락방에서 홀로 책이나 읽고 있는 사람보다 더 소외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민주시민들에게 까뮈의 철학과 사상은 강한 호소력으로 다가온다. 까뮈는 인간의 삶과 사회의 부조리를 철저히 깨닫고 반항해 나가는 인간, 즉 본질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했지 않았나 싶다.
일례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원산지 유통 관련해서 대형마트의 문제점과 전통시장의 문제점이다.
다시 말해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나쁜 물건을 들여 놓을 수가 없이 관리하는 곳은 대형마트이면서 가격이 비싸다. 반면 전통시장은 가격이 싸면서 관리가 안 되는 곳이다. 특히 개인장사치들이나 전통시장은 유통기한을 비롯하여 원산지까지도 속이는 수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우리네 현실은 이런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 특히 정치를 하는 위정자들은 이러한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법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데도 대기업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 겉으로만 서민서민 외치며 정의로운 사회 만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의 영달에 옥죄이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서는 (국회의원평생연금법안) 새누리당과 100프로 찬성으로 통과 시킨 위정자들이 아닌가?
오늘따라 까뮈의 작품들이 새롭게 떠오른 것은 어떤 연유일까? 즐거워해야 할 성탄절에 위정자들의 내면세계를 더듬는 반면 서민들의 힘든 삶이 비쳐진다.
언제나 이방인처럼,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야욕을 갖는다는 것을 까뮈는 알고 있을까? 내년지방선거를 겨냥한 위정자들의 가증스런 행보가 의심스러워지는 성탄절이다.
<저작권자©참살이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12-25 11:21 송고

